부동산 중심의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가계자산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금융자산은 실물자산이라고도 하며, 실물자산에는 부동산 이외의 귀중품, 재고품, 회원권, 라이센스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계자산은 부동산, 기타부동산, 금융자산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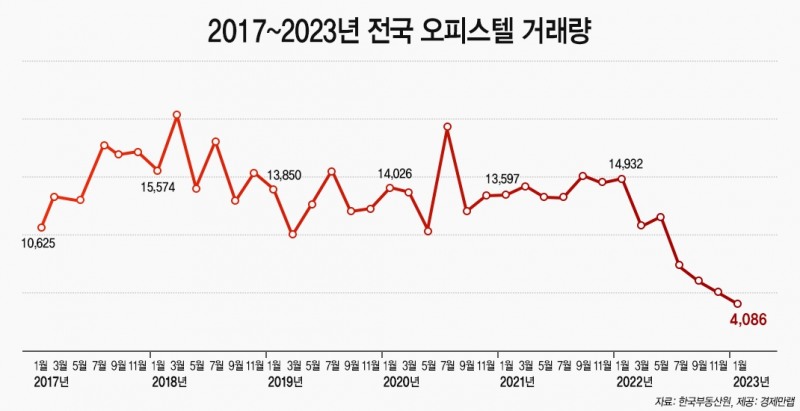
가계자산 구성

2024년 5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5억 2,727만원으로 2022년 대비 3.7% 감소했다. 금융자산은 2022년 대비 3.8% 증가했다. 1년 전에는 실물자산이 5.9%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가계 자산이 감소한 것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11년 만이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2023년 12월 7일(목))
2023년 평균 총자산(5억 2,727만원)은 금융자산이 23.9%(1억 2,587만원), 실물자산이 76.1%(4억 140만원)로 나누어진다. 심각한 것은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4억1424만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총자산의 78.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의존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78.6%로 지나치게 높다. 2021년 기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28.5%), 일본(37.0%), 영국(46.2%)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2014년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작성한 ‘2014년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를 보면, 2014년 조사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만 부동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금융회사가 부동산만 바라보는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5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방법은 ‘예금'(88.8%), ‘주식'(8.7%), ‘개인연금’. (1.5%). 대부분은 예금으로 보관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위 20% 소득 계층(5분위)이 총액입니다. 자산의 15.1%가 주식에, 14.6%가 펀드에 투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중산층(소득 61~80%, 2분위) 하위그룹은 총자산의 91.1%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반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이 부동산을 독점하고, 중산층은 부동산 투자 여력이 없어 주식에 투자한다. 우리나라 가계부동산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금 투자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정치인들이 잘했다. 부실 상장기업은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는다. 부엉이 공시, 깜짝 공시를 자주 하는 파렴치한 기업, 일반주주를 무시하는 등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해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다. 즉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책무다.
상법 ‘이사 충실의무’ 개정 논란 (출처: 법률신문 2024.11.30.)
상법 개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성실의무) “이사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를 “회사를 위하여”로 개정하였다.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지금까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서로 달랐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명백한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SK 등 16개 대기업 CEO 긴급 성명…”상법 개정 중단하라” (출처: 연합뉴스, 2024년 11월 21일)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며 “많은 기업이 과도한 소송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으로 인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사의 충성의무 범위를 회사는 물론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회사’를 이사 의무의 상대방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주주 이익 보호를 추구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상법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개정되길 바랍니다. 자금을 부동산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